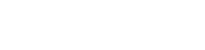조선은 읍성의 나라였다. 어지간한 고을마다 성곽으로 둘러싸인 읍성이 있었다. 하지만 식민지와 근대화를 거치면서 대부분 훼철되어 사라져 버렸다. 읍성은 조상의 애환이 담긴 곳이다. 그 안에서 행정과 군사, 문화와 예술이 펼쳐졌으며 백성은 삶을 이어갔다. 지방 고유문화가 꽃을 피웠고 그 명맥이 지금까지 이어져 전해지고 있다. 현존하는 읍성을 찾아 우리 도시의 시원을 되짚어 보고, 각 지방의 역사와 문화를 음미해 보고자 한다. <기자말>[이영천 기자]고속도로가 뚫려 지금이야 지척이지만, 예전에는 오지나 다름없었다. 이른 시각 출발해도 도착하면 반나절이 훌쩍 지나있었다. 남부터미널에서 버스로 두세 시간은 달려야 서산, 거기서 다시 완행버스를 타야 겨우 닿는 곳이었다. 90년대 초반, 이곳 찾을 일이 잦았다. 당시 첫 직장에서 내가 맡은 업무가 '해미 도시계획'이었다. 당시 관련 법에 따라 도시기본계획과 재정비계획을 수행하는 절차였다. ▲ 해미읍성(1872년지방지도_부분)둥글게 그려진 성곽, 해미천, 산줄기 등이 간결하게 표현되었다. 읍성 안에는 동헌, 객사, 청허정 등이 빼곡하다.ⓒ 서울대학교_규장각_한국학연구원 그때도 읍성은 위풍당당했고, 남문 중심의 저잣거리는 아담했다. 부챗살처럼 펴진 길 따라 낡은 집들은 옹기종기 평화로웠다. 저자는 해미천을 건너지 않았고, 가톨릭 성지엔 아는 사람만 알음알음 찾아 들었다. 해미성당은 소담했다. 순교성지사업을 주관하던 신부님께서 휑한 순교 터 작은 오두막에서 기거하신 걸로 기억한다. 그 신부님과 당시 많은 얘길 나누었다. 도시계획에 순교성지를 여하간 반영해야 했기에 당연한 순서였다. 다정다감하고 박학하신 분이라 도움도 많이 받았다. 가톨릭 역사는 물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도 여러 생각을 주고받았다. 성지를 꾸려야 한다는 사명감과 결기 서린 표정도 생생하다. 유쾌한 분이셨고, 잦지는 않았으나 한번 잔을 들면 곧 새벽이기 일쑤였다. 비워진 술병만큼 가톨릭과 해미에 대한 지식은 넓고 깊어만 갔다. ▲ 해미순교성지1866년 병인박해 때 가장 많은 신자가 순교하였다. 내포지역 무명 순교자 터인 이곳은 1995년 이후 각고의 노력으로 성지화를 완료한[김병기 기자]▲ 지난 9일 <중앙일보> 지면과 온라인판에 실린 '산불과 물난리를 대하는 환경단체의 태도'란 제목의 기사ⓒ 중앙일보PDF 전제가 틀리면 그 값은 거짓이고 궤변이다. 무분별한 하천 준설과 임도 난립, 세종보 재가동에 반대하는 환경단체를 싸잡아 비판한 지난 9일자 <중앙일보> '산불과 물난리를 대하는 환경단체의 태도' 칼럼(로컬 프리즘)을 보면서 든 생각이다. 하천을 준설하면 무조건 홍수가 예방되나? 산불 진화가 어려웠던 건 임도가 없어서였을까? <중앙> 칼럼은 환경단체를 훼방꾼인양 몰아붙이면서 정작 그 전제가 되는 질문에는 응답하지 않았다.[하천 준설] 대전 3대 하천의 재퇴적... 밑빠진 독에 물붓기▲ 대규모 준설을 진행하는 갑천 모습ⓒ 이경호▲ 불무교 상류를 준설중인 모습ⓒ 이경호 <중앙> 김방현 대전총국장이 환경단체를 비판하는 데 제일 먼저 쓰인 소재는 대전시의 대전천·유등천·갑천 등 3대 하천 준설사업이다. 대전시는 190억 원을 투입, 총 20.7㎞ 유역에서 25t 트럭 3만7000대 분량의 퇴적토 50만4000㎥를 퍼내고 있다. 김 국장은 "(이는) 통수 단면(물그릇)을 확보, 집중호우에 대비하기 위해서"라고 적시했다. 대전시 입장이기도 하다. 김 국장은 "대전시가 일방적인 준설로 하천 생태를 파괴하고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반발하는 환경단체 입장을 전하면서도, 또 "환경단체는 '기후변화에 따른 물난리에 대비해야 한다'고도 한다, 도대체 어쩌자는 말인지 모르겠다"고 힐난했다. 하지만 그가 대전 지역 환경단체 홈페이지에 떠있는 보도자료만 봤다면 환경단체들이 무슨 말을 하는 지는 확인할 수 있다.김 국장과 대전시는 하천 준설이 홍수 예방의 만병통치약인양 주장하지만, 대전환경운동연합과 대전충남녹색연합은 그동안 준설의 효과와 경제성 등을 면밀하게 검증해왔다. 두 단체는 지난해 10월 23일에 발표한 성명을 통해 "1년도 되지 않아 다시 퇴적되는 효과 없는 준설을 중단하라"고 촉구하며 현장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이들이 효과 없는 준설의 대표적인 예로 든 것은 대전시가 2024년 4월~8월에 총 42억을 들인 3대 하천의 대규모 준설사업이다. 당시 대전시는 홍수 예방을 내세워 6개 지역에 118,643㎥의 모래와 자갈을 준설했다. 하지만 그 전 해보다 적은 강수량에도 3대 하천 둔치는 모두 잠겼고, 준설 구간의 교량은 통